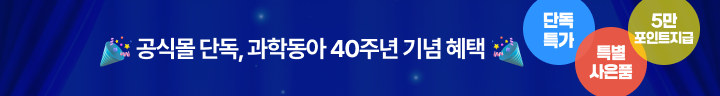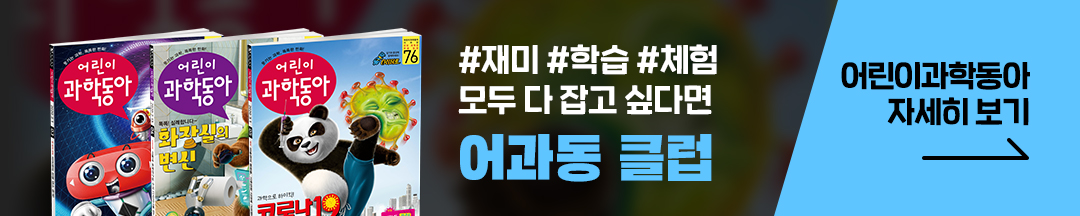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위대한 분자생물학자인 자크 모노(Jacques Monod)가 과학의 창의성에 대해 강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정확한 표현은 잊어버렸으나 그는 대략 이렇게 말했다. 어떤 화학 문제를 풀어야 할 때 그는 스스로에게 “만약 내가 하나의 전자였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라고 자문해 보았다고 말이다.
과학자들은 궁금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전자, 원자’ 같은 단어를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질 만도 한데 과학자들은 호기심을 가지며 대하니까요. 어려운 문제도 흥미를 느끼며 대하는 과학자들. 아이들이 과학자처럼 과학에 흥미를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라면 파인만 박사의 아버지처럼
어쩌면 리처드 파인만 박사의 아버지에게서 한 수 배울 수도 있을 거예요. 양자전기역학 이론을 개발한 공로로 1965년 노벨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한 파인만 박사. 과학계에서도 유명하지만 『파인만씨 농담도 잘하네』 등의 대중적인 저술가로도 유명해요. 파인만 박사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과학을 하는데 많은 영감을 줬다고 말해요.
어렸을 적 파인만 박사는 신기한 것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장난감 기차에 실려 있던 구슬이 기차가 멈추면 앞으로 굴러가는 걸 발견했지요. 궁금한 마음에 왜 그렇게 되는지 아버지에게 물어본 파인만 박사. 이런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기차가 서면 당연히 구슬이 앞으로 굴러가는 거지."
어쩌면 이 정도의 대답을 해줄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한 걸, 왜 묻니?’ 하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파인만 박사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줬다고 해요.
"그것은 아무도 모른단다.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누가 밀지 않는 한 그대로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란다. 이러한 성질을 '관성'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모른단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야기해주기
파인만 박사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해요. 이 정도의 설명은 물리를 매우 깊이 이해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단순히 '관성'이라는 이름만 가르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관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신 것이다. 아이였던 파인만 박사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기차를 굴리면서 구슬을 살폈어요. 신기한 눈으로, '과학은 정말 재미있는 거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요. 파인만 박사의 아버지는 어린 아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다고 해요. 그리고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야기해주었지요.
예를 들어, 티라노 사우르스 렉스 같은 공룡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책에 나오는 설명은 '이 공룡은 키가 약 7~8m이며 머리둘레가 약 2m 정도이다.'라고 나와요. 그럴 때, 파인만 박사의 아버지는 책을 읽어주다가도 잠깐 멈추며 생각을 한 다음 이렇게 말씀해주셨다고 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자. 만약 이 공룡이 우리 집 앞뜰에 서 있다면 머리가 여기 2층 창문에 닿을 정도로 키가 크다는 말이구나. 하지만 머리가 너무 커서 창문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겠구나."
과학을 공부할 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호기심이에요. 그런데, 호기심은 그냥 자라나지 않아요. 꾸준히 자극을 주어서 '당연함'과 '익숙함'을 멀리하게 만들어줘야 하니까요. 그렇게 해주려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하기 쉽게끔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아이가 어떤 현상을 보고 궁금해하는 순간, 과학과 관련된 책을 읽고 무언가를 물어보는 순간, 좋은 자극을 주기 위해 조금 더 고민하고 신경 써서 말을 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